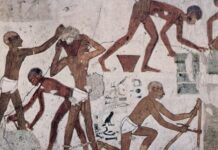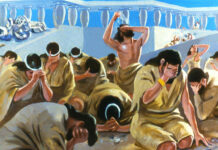룻이 나오미를 대신하여 재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보아스를 찾아온 날 밤.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의무감으로 만난 두 사람은 자칫 사무적이고 의무적일 수 있는 만남을 넘어 남녀의 어색한 긴장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자애로운 마음뿐 아니라 자원하여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두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날 아침 해가 밝기 전 새벽같이 룻을 돌려보냅니다.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서둘러 움직여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여섯 번을 되어주며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룻 보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를 향한 답변이었습니다.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노라 울먹이며 한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맴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두고 보라고 반드시 꽉 채우기 위해 돌아오겠노라’는 약속을 담아 비언어적인 요소로 보리를 덜어준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어버렸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삶의 목적과 낙을 잃어버렸습니다.
애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애와 배려로 인해, 그리고 룻의 헌신적 노동을 통해,
나오미는 이미 충분한 양식의 곡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조금은 희망을 찾은 나오미였으나 여전히 나오미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그래서 먹고살 걱정을 덜고 나면 인생의 낙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해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보리 여섯으로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밀 추수가 끝나가는 시기임에도 밀이 아닌 보리를 되어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곱 번이나, 혹은 크게 한번이 아니라, 여섯 번을 되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보리의 히브리어 단어는 ‘세오라’인데 원래 뜻은 거칠음 이라는 뜻입니다.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폭풍우 치는, 회오리바람 치는, 거친 바람에 떨리는, 두려워하다, 공포에 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사를 명사형으로 했을 때 거칠음, 혹은 보리라고 번역됩니다.
아마 보리의 곡식 표면이 촉감상 거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리처럼 거친 인생이 여섯번 되어진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쉬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듯 고고 거친 인생들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 안식입니다.
여섯 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듯한 날들이 지나면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수고한 땅은 안식년을 기다립니다.
보아스가 되어준 여섯 번의 보리는 거친 인생을 이제 끝내고 마지막 안식을 기다리라는 보아스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룻3:1에서 나오미와 룻이 기다리던 바로 그 안식,
이제 보아스가 그 안식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은 이제 보아스를 기다리며 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안식이 되어주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안식이 되어주십니다.
그 안식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