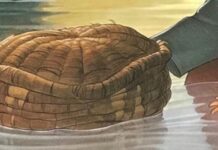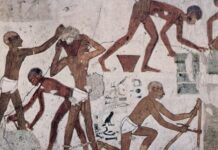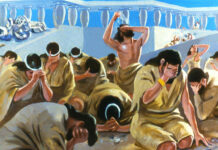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먹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이 목표였던 시대도 있었고, 쌀밥에 고깃국이 목표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느끼기에 인류가 ‘먹는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현재에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여전히 인류의 50% 가까이나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본성 속에 남아 그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가 다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까 봐 우리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내재한 채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함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데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를 상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 끊임없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 세계를 채우셨습니다.
덕분에 인간은 끊임없이 먹을 것이 공급되어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떠안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고사는 문제를 인간에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시며 그들의 불안을 조장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체들을 채우기에 앞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의 조류와 어류보다도, 여섯째 날의 짐승들과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거리인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식물들이 얻을 에너지원인 빛을 비추어줄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시면서,
식물이 창조되던 날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시는 빛을 직접 식물에게 비추어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을 계획하시며 먹을거리를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적인 먹거리만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창조의 본문을 살펴보면 씨앗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이 씨앗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씨앗)’이라는 표현에도 사용되며,
그 후손(씨앗)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는지 우리는 족보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에서 이 씨앗은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에게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씨앗)인 예수님께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씨앗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는 예표적인 단어입니다.
셋째 날 창조에서 정작 식물은 씨앗도 없이 먼저 땅에서 나옵니다.
마치 여자에게서만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양식으로 준비된 분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고 타락하기도 전에, 그래서 인생들이 잠재적인 불안함과 막연한 두려움에 내던져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부터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 육 간의 온전한 양식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만족이 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겐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0,33)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